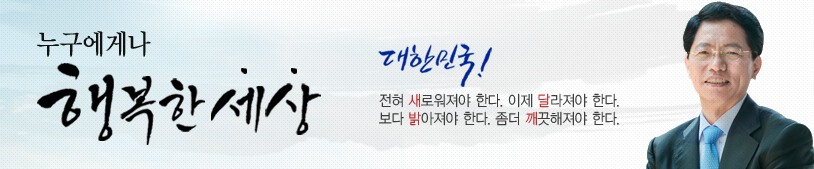
새·달·밝·깨
민주주의로 가는 길
제왕적 대통령
얼마 전에 벤 브래들리 전 워싱턴 포스트(WP) 편집인이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휘하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을 할 때 편집국장이었다. 그는 WP를 세계적 권위지로 성장시킨 걸출한 언론인이었다. 이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비밀공작팀이 워터게이트호텔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를 도청하려다 발각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쳤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낙마한 닉슨은 대통령의 권한을 극한까지 추구한 ‘황제대통령(Imperial Presidency)’으로 불린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또 하나의 제왕적 대통령이었으되, 워싱턴, 링컨과 더불어 ‘위대한(great) 대통령’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닉슨과는 다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무려 37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법원과도 마찰을 일으켜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대법원이 뉴딜정책 관련 법률에 대해 번번이 위헌판결을 하자 루즈벨트는 ‘대법관 정원 조작’(court-packing)이라고 조롱받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신의 대법관 9명 중 70세가 되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대법관이 생길 때마다 1명씩을 추가로 임명하여 최대 15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 의도야 뻔하다. 내 생각과 비슷한 대법관을 추가 임명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한다고는 차마 말하지 않았다. 법률안은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의회는 자기가 공들여 만든 법률을 위헌 선언하는 사법부도 미웠지만, 그렇다고 그 와중에 난데없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닉슨 대통령은 집무실에 녹음시설을 해놓고 평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었다. 특별검사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이 관여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집무실 녹음테이프를 입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하자 닉슨 측이 대통령의 특권을 주장하며 불복하여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갔다. 제왕적 대통령 닉슨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천연덕스럽게 강변하였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루이 14세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하급심 결정을 지지했다.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그 직후 닉슨은 사임하게 된다.
최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개헌 논의가 일고 있다. 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 것은 결국 입법부와 사법부와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사라지게 하는 길도 다르지 않다. 헌법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의 엄격한 분립과 상호 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50년 동안 백악관을 출입하다가 작년 92세에 타계한 헬렌 토머스 기자가 한 명언을 되새겨볼 때다. (법률신문 2014. 11. 3.자)
보고서를 던져버려야 하는 이유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던진 취임 화두는 공판중심주의였다.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통해 유·무죄의 심증(心證)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에 의존하는 종래의 ‘조서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06년 9월 일선 법원에 가서 거칠게 말했다.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장난치는 것이다”라는 게 요지였다. 검찰과 재야법조계 반발을 샀지만 맥은 제대로 짚었다.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은 이용훈 사법부의 업적이다.
법정에서는 증인의 표정·눈빛·태도를 직접 보면서 들어봐야 진실을 캘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서에는 그런 숨소리가 없다. 진정성과 현장성은 글이 아니라 말에서 나온다. 문서는 각자가 구미에 맞게 써내는 것이라는 지적은 정도의 문제이지 대체로 맞는 말이다.
요즘 법정 풍경은 예전과 다르다.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변론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전에 법조인은 공소장, 논고문, 변론요지서, 의견서,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과 같은 서면(書面)을 잘 쓰는 것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변론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법조계가 서면 중심에서 구술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다. 법정에서 대립 당사자를 설득하면서 원만하게 변론을 이끌어가는 판사의 재판 능력 핵심도 이제는 말하기 실력이다. 판사가 활약하는 주 무대는 고독한 판사실이 아니라 말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정이 되었다. 사회가 글의 시대에서 말의 시대로 바뀌어 갔다. 국어교육도 글쓰기에서 말하기로 중심이 이동했다. 기업체의 입사 면접에서도 PT가 등장했다.
19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됐다. 수사기관의 논리가 적혀 있는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영장 판사가 직접 만나서 그 해명을 들어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해 직접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관 대면권(對面權)은 피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다.
서면이라는 것은 아무리 글자 크기와 글꼴을 달리하고 음영을 넣고 밑줄을 치고 색깔을 바꾼들 어디까지나 글자 모음에 불과하다. 심하게 말하면 속이거나 숨기거나 분식·왜곡·과장·윤색할 수도 있다. 윗사람에게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도 결코 다르지 않다. 문서에 적힌 글자와 현란한 보고서의 허상(虛像)만 보고 판단하고 결재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수사기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구두 변론이라면, 보고서의 결함을 메워주는 것이 대면보고다. 대면은 보고서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중요 포인트를 강조해 설명하고, 그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고, 때로는 하소연도 듣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설득도 하고,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는 그야말로 쌍방향 소통 방식이다. 소신을 펼치는 기회이자 힘을 실어주는 자리, 상호 이해와 공감과 공명(共鳴)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 이리저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묘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서로에게 피드백이 가능해진다. 토론으로 이어져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놀라운 해답을 찾기도 한다. 소통과 대화는 힘이 있다.
대면은 반대 논리를 듣고 설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세종은 어전회의에서 특정 안건이 만장일치가 되면 시행을 보류시켰다. 반드시 간관으로 하여금 반대 논리를 개진토록 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을 면밀히 재본 뒤 시행토록 한 것이다. 대통령도 찬반양론을 듣고 반대자를 설득하는 대면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직언을 들을 자신감이 없는 지도자는 대면을 피한다.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은 설득력이다. 대면하지 않고 설득할 방법은 없다. 찬성 논리만이 아니라 반대 측 논리와 의견을 듣고 설득해야 올바른 결론이 나오고 정책이 실행력을 갖는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보고서를 읽고 전화하고 결재하는 외로운 집무실이나 관저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면하는 접견실·회의실·안가여야 한다. 대통령직(職)은 집무 중이든, 식사 중이든, 퇴근 후이든 누군가를 대면하고 있어야 할 운명의 자리다. 피의자의 판사 대면권처럼 국민과 여당, 특히 야당·반대자에게는 대통령 대면권이 보장돼야 한다. 권리는 의무와 짝을 이룬다. 피의자 대면이 판사의 의무이듯, 대통령의 국민·반대자 대면은 의무다. 이용훈 식으로 거칠게 말하면 “이제 보고서를 던져버려야 한다.” (중앙SUNDAY 2015. 2. 8.자)
얼마 전에 벤 브래들리 전 워싱턴 포스트(WP) 편집인이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휘하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을 할 때 편집국장이었다. 그는 WP를 세계적 권위지로 성장시킨 걸출한 언론인이었다. 이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비밀공작팀이 워터게이트호텔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를 도청하려다 발각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쳤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낙마한 닉슨은 대통령의 권한을 극한까지 추구한 ‘황제대통령(Imperial Presidency)’으로 불린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또 하나의 제왕적 대통령이었으되, 워싱턴, 링컨과 더불어 ‘위대한(great) 대통령’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닉슨과는 다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무려 37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법원과도 마찰을 일으켜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대법원이 뉴딜정책 관련 법률에 대해 번번이 위헌판결을 하자 루즈벨트는 ‘대법관 정원 조작’(court-packing)이라고 조롱받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신의 대법관 9명 중 70세가 되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대법관이 생길 때마다 1명씩을 추가로 임명하여 최대 15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 의도야 뻔하다. 내 생각과 비슷한 대법관을 추가 임명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한다고는 차마 말하지 않았다. 법률안은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의회는 자기가 공들여 만든 법률을 위헌 선언하는 사법부도 미웠지만, 그렇다고 그 와중에 난데없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닉슨 대통령은 집무실에 녹음시설을 해놓고 평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었다. 특별검사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이 관여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집무실 녹음테이프를 입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하자 닉슨 측이 대통령의 특권을 주장하며 불복하여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갔다. 제왕적 대통령 닉슨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천연덕스럽게 강변하였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루이 14세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하급심 결정을 지지했다.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그 직후 닉슨은 사임하게 된다.
최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개헌 논의가 일고 있다. 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 것은 결국 입법부와 사법부와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사라지게 하는 길도 다르지 않다. 헌법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의 엄격한 분립과 상호 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50년 동안 백악관을 출입하다가 작년 92세에 타계한 헬렌 토머스 기자가 한 명언을 되새겨볼 때다. (법률신문 2014. 11. 3.자)
보고서를 던져버려야 하는 이유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던진 취임 화두는 공판중심주의였다.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통해 유·무죄의 심증(心證)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에 의존하는 종래의 ‘조서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06년 9월 일선 법원에 가서 거칠게 말했다.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장난치는 것이다”라는 게 요지였다. 검찰과 재야법조계 반발을 샀지만 맥은 제대로 짚었다.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은 이용훈 사법부의 업적이다.
법정에서는 증인의 표정·눈빛·태도를 직접 보면서 들어봐야 진실을 캘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서에는 그런 숨소리가 없다. 진정성과 현장성은 글이 아니라 말에서 나온다. 문서는 각자가 구미에 맞게 써내는 것이라는 지적은 정도의 문제이지 대체로 맞는 말이다.
요즘 법정 풍경은 예전과 다르다.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변론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전에 법조인은 공소장, 논고문, 변론요지서, 의견서,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과 같은 서면(書面)을 잘 쓰는 것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변론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법조계가 서면 중심에서 구술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다. 법정에서 대립 당사자를 설득하면서 원만하게 변론을 이끌어가는 판사의 재판 능력 핵심도 이제는 말하기 실력이다. 판사가 활약하는 주 무대는 고독한 판사실이 아니라 말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정이 되었다. 사회가 글의 시대에서 말의 시대로 바뀌어 갔다. 국어교육도 글쓰기에서 말하기로 중심이 이동했다. 기업체의 입사 면접에서도 PT가 등장했다.
19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됐다. 수사기관의 논리가 적혀 있는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영장 판사가 직접 만나서 그 해명을 들어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해 직접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관 대면권(對面權)은 피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다.
서면이라는 것은 아무리 글자 크기와 글꼴을 달리하고 음영을 넣고 밑줄을 치고 색깔을 바꾼들 어디까지나 글자 모음에 불과하다. 심하게 말하면 속이거나 숨기거나 분식·왜곡·과장·윤색할 수도 있다. 윗사람에게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도 결코 다르지 않다. 문서에 적힌 글자와 현란한 보고서의 허상(虛像)만 보고 판단하고 결재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수사기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구두 변론이라면, 보고서의 결함을 메워주는 것이 대면보고다. 대면은 보고서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중요 포인트를 강조해 설명하고, 그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고, 때로는 하소연도 듣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설득도 하고,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는 그야말로 쌍방향 소통 방식이다. 소신을 펼치는 기회이자 힘을 실어주는 자리, 상호 이해와 공감과 공명(共鳴)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 이리저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묘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서로에게 피드백이 가능해진다. 토론으로 이어져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놀라운 해답을 찾기도 한다. 소통과 대화는 힘이 있다.
대면은 반대 논리를 듣고 설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세종은 어전회의에서 특정 안건이 만장일치가 되면 시행을 보류시켰다. 반드시 간관으로 하여금 반대 논리를 개진토록 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을 면밀히 재본 뒤 시행토록 한 것이다. 대통령도 찬반양론을 듣고 반대자를 설득하는 대면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직언을 들을 자신감이 없는 지도자는 대면을 피한다.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은 설득력이다. 대면하지 않고 설득할 방법은 없다. 찬성 논리만이 아니라 반대 측 논리와 의견을 듣고 설득해야 올바른 결론이 나오고 정책이 실행력을 갖는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보고서를 읽고 전화하고 결재하는 외로운 집무실이나 관저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면하는 접견실·회의실·안가여야 한다. 대통령직(職)은 집무 중이든, 식사 중이든, 퇴근 후이든 누군가를 대면하고 있어야 할 운명의 자리다. 피의자의 판사 대면권처럼 국민과 여당, 특히 야당·반대자에게는 대통령 대면권이 보장돼야 한다. 권리는 의무와 짝을 이룬다. 피의자 대면이 판사의 의무이듯, 대통령의 국민·반대자 대면은 의무다. 이용훈 식으로 거칠게 말하면 “이제 보고서를 던져버려야 한다.” (중앙SUNDAY 2015. 2. 8.자)





